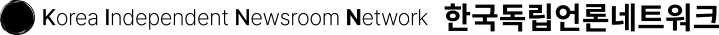디르크 반 델렌, '교회 내 성상 파괴'

| 성스러움의 해체 |
처음 이 그림을 보았을 때,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네덜란드 화가 디르크 반 델렌(Dirck van Delen, 1605-1671)이 그린 이 작품은 단순한 역사 기록화가 아닙니다. 종교개혁의 격랑 속에서 일어난 성상 파괴 운동의 현장을 포착한 이 그림을 보고 있노라면, 신앙과 예술, 파괴와 개혁이라는 모순된 가치들이 충돌하는 그 극적인 순간이 4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1630년경에 그려진 이 작품은 참 흥미롭습니다. 실제 사건으로부터 약 64년이 지난 시점에 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1566년을 중심으로 네덜란드 전역을 휩쓴 성상 파괴 운동은 이미 역사책 속의 이야기가 되었지만, 반 델렌은 이 사건을 자신만의 시각으로 재해석하여 화폭에 옮겼습니다. 건축화의 대가답게 고딕 성당의 웅장한 내부를 정밀한 원근법으로 재현했지만, 그가 정말로 보여 주고 싶었던 것은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인간들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차갑고도 담담한 그의 시선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보여 줍니다.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사람들이 교회당 내부의 조각상을 끌어내리고, 제단화를 망치로 내리찍고, 돈이 될 만한 것은 모조리 약탈해 갑니다. 심지어 저 멀리 위층의 흐릿한 곳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마저 끌어내려지고 있습니다. 중세 이래 수백 년간 사람들의 기도를 받아 온 예술품들이 한순간에 우상으로 낙인찍혀 파괴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칼뱅이 <기독교강요>에서 경고한 바로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나면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권능 역시 그 형상에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그의 우려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역설이 있습니다. 성상을 부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 역시 또 다른 형태의 열광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우상숭배를 거부한다는 명분으로 행해지는 이 파괴 행위가 그 자체로 어쩌면 또 다른 광기일 수 있습니다. 반 델렌은 이러한 모순을 참으로 영리하게 화폭에 담습니다. 예배당의 거대하고 숭고한 건축 공간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인간들의 난폭한 행위가 극명한 대조를 보여 줍니다.
| 루터와 칼뱅: 미묘한 차이 |
이 작품을 보면서 저는 루터와 칼뱅의 입장 차이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세대 개혁가인 루터는 의외로 온건했습니다. 그는 개혁자였지만, 교회 내 조각이나 그림 자체를 악으로 보지 않던 인물입니다. "그림이나 조각은 우상숭배 없이 만들어졌고 그러므로 그것들을 만드는 것은 금지되지 않았으며, 중요하게 말씀하신 '너는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는 계명은 원래대로 보존된다"고 말합니다. 성서의 이야기를 묘사하는 그림이 "성서의 문자와 유사한 방식으로 교훈을 주며 구원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츠빙글리와 2세대 개혁가인 칼뱅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어떤 형식이든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 자체를 금지했고, 성상은 결국 우상숭배로 이어진다고 확신했습니다. 츠빙글리는 칼뱅보다 더 강경하게 모든 종교적 형상과 이미지를 완전히 금지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반 델렌의 그림 속 파괴자들은 분명 칼뱅파입니다. 그들에게 예배당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모든 조각과 그림은 제거해야 할 우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화가는 참 신중합니다. 이들을 영웅으로도, 악마로도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었던 일을 담담하게 보여 줄 뿐입니다. 그리고는 최종 판단을 우리 몫으로 남겨 둡니다.
| 파괴 속에 남겨진 것 |
제가 이 그림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본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반 델렌이 이 파괴의 현장을 그리면서도 건축물의 아름다움만은 놓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칼뱅이 "이 세계의 형태와 빛을 통해 아름다움이 나타나며 이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말한 것처럼 화가는 오히려 텅 빈 공간 자체의 숭고함에 주목합니다. 창문으로 쏟아지는 빛, 하늘 향해 솟은 고딕 성당의 기둥들…. 이것들은 그 자체로 신을 향한 인간의 갈망을 표현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가 진정으로 추구한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을 추구하는 미학"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칼뱅의 눈으로 보면, 인위적인 장식을 모두 걷어냈을 때 드러나는 순수한 공간의 아름다움,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성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400년 전 그림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역시 비슷한 질문들과 씨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신앙일까요? 예술은 종교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신앙과 과학은? 초기 기독교인들의 순수한 신앙심이 중세 말기에 이르러 수많은 성유물을 집착하는 것으로 변질된 것처럼, 모든 종교적 열정은 극단으로 치달을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도 무언가를 맹목적으로 숭배하거나 파괴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 그림을 보면서 돌아봅니다. 우리가 성스럽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고, 우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엇인지 말입니다. 반 델렌은 차가우면서도 따뜻한 시선으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진 양면성을 화폭에 담습니다. 결국 이 작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파괴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인간이 절대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모순과 갈등, 그리고 그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입니다. 성상을 숭배하는 것도, 그것을 파괴하는 것도 모두 인간의 선택입니다.
반 델렌은 루터처럼 중용을 택하지도, 칼뱅처럼 단호하게 편을 들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저 한 시대의 격변을 화폭에 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 대답은 오롯이 당신의 몫입니다.
최주훈 / 중앙루터교회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