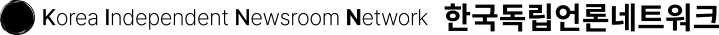요하네스 베르메르, '우유 따르는 여인'

베르메르(Johannes Vermeer, 1632-1675)의 '우유 따르는 여인'을 보신 적 있나요? 45.5 x 41cm의 작은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뭔지 모를 차분함이 찾아듭니다. 평범한 여인이 우유를 따르는 단순한 이 모습이 그리도 경건하게 보일 수 없습니다. 참 이상한 그림입니다. 한참을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거룩함'을 교회 안에만 가둬 놨을까? 주일예배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라고 여기고, 나머지 6일은 왜 그리도 의미 없는 듯 스쳐 보냈을까? 베르메르의 이 작품은 저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부엌은, 당신의 일터는, 당신의 일상은, 과연 하나님과 무관한 공간인가요?'
베르메르가 살던 삶의 자리로 들어가 봅니다. 그는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살던 화가입니다. 당시 네덜란드는 칼뱅주의 신학이 사람들의 삶에 녹아들었고, 이를 자부심으로 여겼습니다. 칼뱅은 루터를 따라 "일상의 노동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고 말합니다. 이는 골로새서 3장 23절의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프로테스탄트 정신이며, 이러한 사상이 이 작품에 온전히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대 가톨릭이 일상과 거리를 둔 수도원 생활을 지고의 영성으로 여겼지만, 칼뱅주의자들은 농부의 땀, 상인의 정직, 어머니의 가사노동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삶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베르메르의 '우유 따르는 여인'에는 이런 '일상의 거룩함'이 녹아 있습니다.
| 캔버스에 숨겨진 이야기 |
1929년 앨런 버로스가 이 작품을 엑스레이로 분석한 일이 있는데,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베르메르가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여러 번 그림을 고쳤다는 겁니다. 오른쪽 하단의 발난로는 원래 버드나무로 짠 화재 바구니였고, 2022년 레이크스뮤지엄의 최신 분석에 따르면 여인의 머리 뒤 벽에는 주전자 걸이와 여러 주전자들이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왜 베르메르는 이런 것들을 지워 버렸을까요? 다양한 추측이 가능하지만, 제 생각에는, 복잡한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우유를 따르는 그 순간 자체에 더 집중하게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칼뱅이 종교적 장식을 걷어내고 말씀의 본질에 집중했듯이, 베르메르도 시각적 '소음'을 줄이고 노동의 본질적 가치를 드러낸 것이지요. 이렇게 여러 번 수정을 거친 이 그림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술가든 신학자든, 진정한 대가들은 무엇을 더할지가 아니라 무엇을 뺄지를 고민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작품을 봅시다. '우유 따르는 여인'이라는 제목부터 시작해 봅시다. 영어 작품명이 "The Milkmaid"이다보니 그림 제목을 아예 '우유 따르는 하녀'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하녀인지 아니면 당시 평범한 여성인지는 미술사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거리입니다. 하녀로 보는 이들은 전형적인 하인의 옷차림을 증거로 들지만, 이런 옷차림은 네덜란드에서 하인뿐 아니라 평범한 가정의 주부나 딸들에게서도 흔히 볼 수 있으며, 베르메르의 다른 작품 '편지 읽는 여인'이나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에서 볼 수 있듯이, 특정 신분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작품이 많다는 이유로 하녀로 보기 어렵다는 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어떻게 보든, 우리에겐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하녀로 볼 수도 있고, 당시 가정의 전형적인 여성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대목은 노동의 아름다움과 가정의 평온함에 베르메르가 집중한다는 점입니다.


저에게 정작 특별하게 보이는 대목은 여인이 아니라 빛입니다. 어쩌면 진짜 주인공은 '빛'일 겁니다. 왼쪽 창문에서 흘러드는 빛이 일하는 여인의 얼굴과 손을 부드럽게 감싸고, 우유의 흐름을 생생하게 드러냅니다. 흥미로운 건 창문 자체는 부분적으로만 보인다는 점입니다. 작품에선 그저 빛의 효과만 있고, 그 근원은 액자 밖에 숨어 있습니다. 빛의 신비로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평범한 장면에 숭고함이 더해집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고 아름답게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때로 자기 몸을 숨깁니다. 진리라는 것, 그리고 참으로 가치는 있는 것들은 때로 우리 시야에 잡히지 않습니다. "거룩한 것, 가장 귀한 것은 숨겨져 있다."라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말은 사실입니다["Abscondita est ecclesia, latent sancti.": 마르틴 루터, <노예의지론>(1525), in: WA 18,652,23.]. 바로 이 장면처럼 말입니다.
색채 선택도 탁월합니다. 노란색 상의, 푸른 앞치마, 붉은 톤의 스커트가 만드는 조화를 보세요. 특히 푸른 앞치마에 사용된 울트라마린 블루는 아프가니스탄 청금석에서 추출한 고가의 안료로, 품질 좋은 것들은 금보다 비쌌다고 알려집니다. 청금색이 워낙 비싸고 구하기 어렵다 보니 중세 종교화에선 성모 마리아처럼 고귀한 신분을 드러낼 때나 사용하던 재료인데, 베르메르는 이 귀한 안료를 여인의 앞치마와 탁자보에 아낌없이 사용합니다. 평범한 하녀에게 금보다 비싼 안료를 사용한 이유? 이것이야말로 일상의 노동이 거룩하다는 칼뱅주의 정신의 구현 아닐까요!
| 일상: 영원의 조각 |
이번엔 못 자국이 훤히 드러난 벽 하단을 봅시다. 부엌 바닥 근처 벽에 델프트 타일이 보이시나요. 거기 푸른색의 작고 그림들이 보일 겁니다. 이 타일은 네덜란드 황금기에 일반 가정의 부엌이나 거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식 타일입니다. 이 타일엔 주로 소박한 일상의 주제나 상징적 이미지가 그려집니다. 그림에 눈을 가까이 대고 보면, 몇 개의 그림이 보일 겁니다. 그림의 모양이 모호해서 식별하기 힘들지만, 하나는 분명히 사랑의 신 큐피드가 활을 쏘는 모습이 분명합니다.
이를 상징적인 요소로 해석하면, 사랑 가득한 가정으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당시 사회 통념을 고려한다면 전혀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 시대 문학과 미술에서 하녀처럼 하층 신분의 여성은 종종 성적 대상으로 묘사되었고, 큐피드는 그런 암시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의 큐피드는 일종의 반전 요소입니다. 베르메르는 이 모티프를 포용하면서도 우유 따르는 여성에게 성모 마리아 같은 엄숙한 품위를 부여합니다. 육체적 욕망보다 영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완벽한 뒤집기인 것이지요. 그렇게 보면, 식탁 위 쪼개진 빵들은 성만찬의 떡을 연상하게 만들 정도입니다.
우측 하단 발난로 같은 소소한 일상용품까지도 의미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견디게 해 주는 따뜻함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당시 네덜란드인들의 실용적 신앙관을 보여 줍니다. 하나님은 거창한 곳이 아니라 바로 이런 일상의 한복판에 계신다는 믿음 말입니다. 베르메르가 이 작품을 그리면서 당시 최신 기술이었던 카메라 옵스큐라(초기 카메라 원리)를 활용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가 이런 최신 기술을 작품에 적용한 것도 혁신적인 일로 볼 수 있지만, 그림의 구도도 혁신적입니다. 평범한 여인을 피라미드형 구도의 중심에 배치한 것은 당시 종교화나 왕족 초상화에서나 쓰던 기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여인에게 이런 기념비적 구도를 갖춘 의도야말로 네덜란드 칼뱅주의 정신의 완벽한 시각화 아닐까 싶습니다.
작품 속 여인은 현재 순간에 완전히 몰입합니다. 단순히 집중하고 있는 건지, 깊은 묵상에 잠긴 건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얼굴에 드리운 그림자 때문에 그녀의 표정을 정확히 읽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모호함이 우리를 더 오랫동안 잡아 둡니다.
베르메르의 이 작품은 시공을 넘어 오늘의 우리에게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거창하고 화려한 일, 자극적인 일이 아니더라도, 일상의 작고 평범한 순간들이야말로 고귀하고 거룩하다고 말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종종 여러 가지 일에 마음이 분산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처럼 한 가지 일에 정성을 다하면, 평범한 순간도 특별한 가치를 얻게 됩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마음을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식사할 때는 음식의 맛과 향에, 걸을 때는 발걸음과 주변 풍경에, 책을 읽을 때는 글의 내용에만 집중해 보세요. 잠시 전자기기를 멀리하고 현재 순간에 머물러 보시면, 여러분도 작품 속 여인처럼 일상에서 고귀한 아름다움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덧붙이는 말: 혼란을 딛고 시작한 새 정부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거창한 일이 아니더라도 평범하고 작은 이들의 일상을 귀하게 여기고 지켜 주기만 해도 그걸로 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 나라가 되길 두 손 모아 봅니다. |
최주훈 / 중앙루터교회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