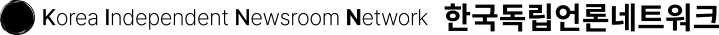<뉴스앤조이>·IVP, <죽을 때까지 유쾌하게> 북 클럽 마지막 시간
봄을 시샘하는 겨울의 마지막 몸부림이라 하여 '꽃눈'이라 불리는 3월의 눈. <죽을 때까지 유쾌하게>를 읽고 모인 마지막 날, 아침부터 눈이 내렸다. 선조들은 이 꽃눈이 내리면 귀한 손님이나 행운이 찾아온다고 믿었다. 따뜻한 봄을 기다리다 맞닥뜨린 차가운 눈 속에서도 위로를 얻고 싶었던 마음이 그런 믿음을 만들어 냈는지도 모르겠다.
마지막 북 클럽은 참가자들이 미리 전달한 질문에 저자가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김혜령 교수는 아버지의 근황을 전화며 대화를 시작했다. 한 참가자의 물음에 김 교수는 아버지의 건강이 호전됐다고 전했다. 잃어버렸던 말을 조금씩 되찾고, 이제는 문장을 만들어 몇 마디 하신다고. 그 말을 듣고 나니 누구에게 향해야 할지 모를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고작' 그 정도에도 감사해야 하냐고 물을지 모르겠지만, 작은 회복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삶을 살아가는 힘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어서 저자는 책에 미처 담지 못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독자들의 질문을 채워 갔다. 아버지가 알츠하이머를 앓게 된 후 함께 살면서 겪은 일들, 자녀와 남편, 남동생 부부, 그리고 어머니까지 온 가족이 새로운 현실에 내몰리며 치열하게 분투했던 시간들. 그 안에서 엷은 질투와 불안도 함께 스며들었다고 고백했다. 특히 저자의 결단, 아픈 아버지를 품고 어머니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굳은 마음으로 가족들의 동요를 잠재웠다는 이야기는 인상적이었다. 저자는 아파트가 떠나가도록 가족들에게 소리쳤다고 했다. 그 일갈에는 가족을 향한 사랑이 확고히 자리하고 있었고 가족들은 그 단호한 모습 앞에서 순복했다. 김 교수는 그 상황을 설명하며 "장성한 자식이 부모를 넘어서야 할 때가 있다"고 말했다. 부모를 넘어선다는 말이 대견하면서도 힘겹고 구슬프게 들려 왔다.
저자는 아버지와 겪은 삶의 이야기에 이어 묵직한 이야기로 우리를 이끌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통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정말 가 있는가. 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정부와 거기서마저 소외받는 이들 사이에서 교회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정부가 다수를 위한 법을 만들 때, 그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수를 기독교는 어떻게 품어야 하는지. 이러한 고민 없이 그저 '도시 하나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을 뒷배 삼아 자신의 권력을 뻗치려는 욕망의 허상인지도 일깨워 주었다.

프랑스 철학자 폴 리쾨르(Paul Ricœur)는 말했다.
"인간이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존재다."
우리 모두,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로 삶의 이야기는 가능하다. 연약한 이도 명백한 인간이기에 자신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다. 나는 연약한 이의 고유한 이야기를 세상에 드러내 알려 준 저자에 감사했다. 북 클럽에 모인 이들은 저자가 적어 내려간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꼈을까? 꽃눈이 내린 3월, 연약함을 진솔히 이야기 해 준 김혜령 교수와 그의 책이 북 클럽을 함께한 이들에게 반가운 손님이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