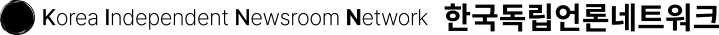[사건과 신학] 코로나19의 교훈과 인류가 나아갈 삶의 방향성
| 외부 기고는 <뉴스앤조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신학위원회가 '사건과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시대적 요청에 대한 신앙고백과 응답을 신학적 접근과 표현으로 정리합니다. 매달 한 가지 주제를 선정해 칼럼을 게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학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뉴노멀; 디스토피아와 유토피아 사이'입니다. |
코로나19 이후 개인적·사회적 삶이 어떤 형식으로 변화할지에 대한 궁금증과 절박한 관심을 반영하는 듯 '뉴노멀' 담론이 많아졌다. 그러나 나는 '뉴노멀'이라는 단어 자체에 거부감이 든다. '표준적·전형적·정규적'이라는 '노멀'(normal)의 사전적 의미가 일상 언어생활에서 느슨해져 '보통의·통상적·정상적'이라는 의미를 갖게 됐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세계를 풍미해 온, 신자유주의 질서와 1960년 군사 쿠데타 이후 한국 사회 산업화·정보화·생명공학화가 추구한 '보통의·통상적·정상적'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을 과연 '노멀'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경제적으로 잘살아 보기', '더 풍요롭게 잘살아 보기'를 추구하는 철학이었다. 더욱이 구소련 몰락 이후, 자본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세계관만이 가장 효율적이고 현실적이라는 암묵적 합의가 학계를 지배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를 맞은 지금,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후 붕괴, 또 다른 전염병 창궐 가능성, 지속 불가능한 경제 양극화, 개인을 구석구석 관찰하는 '빅 브라더' 사회 현실화가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이다. 나는 '뉴노멀'이 좋든 싫든 다음 3가지 특징을 강화해 가는 삶의 패턴을 불러올 것이라고 예견한다.

첫째, 삶의 '단순성'으로 큰 유턴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삶의 단순성이란 '빈곤성'과는 다른 개념이다. 깨어 있는 시민들은 경제 사정에 여유가 있어도 큰 저택·자가용·가구 등 소비를 지양하고, 식생활을 단순화하는 삶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지구 기후 붕괴와 생태 환경보호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 더 자유롭고 만족스러운 삶의 양식이기 때문이다.
둘째, 직접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지금보다 삶의 '연대성'을 극대화하는 생활 방식으로 변화할 것이다. 연대성은 '관계성'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종교적 용어로서는 '만물萬物 동체同體 의식意識'이라고 표현해도 좋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모든 생명이 이리저리 유기체적으로 얽혀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소위 말하는 사회성보다 더 근원적이다. 하찮게 여기거나 적대시한 바이러스 세계, 균·곰팡이 세계, 곤충과 동식물 세계가 인간과 긴밀하게 관계돼 있다는 깨달음을 줬다.
지금까지는 휴대전화나 텔레비전 등 영상 매체를 통한 가상현실에 눈과 귀를 내주었지만, 이제는 길가에 밟히는 잡초와 담쟁이넝쿨과 산야의 들꽃, 지구에서 수십만 년을 견뎌 온 생명의 다양성에 눈뜨고, 그들을 돌보는 '청지기'라는 인류 본연의 자리를 찾아가게 될 것이다.
셋째, '우주적 영성'에 더 깊이 눈뜨고 근시안적 민족주의, 국가주의, 이념 투쟁, 종교 갈등에서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코로나19는 '우주 속에서 인간은 무엇인지' 질문하게 했다. 코로나19는 성직자, 재벌, 정치권력자, 서민을 가리지 않고 감염시켜 생명을 앗아갔다.
우리는 거대한 우주 속, 태양 주위를 도는 작은 녹색 행성에 사는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전통적 제도 종교는 약화할 것이다. 이제 새로운 우주적 영성에 눈뜨고, 종교와 진화 과학의 화해를 추구하는 영성을 목마르게 찾게 될 것이다. 존재 근원과 진화 속에서 '아름답고 새로운 창조적 정신'의 신비를 깊이 생각하게 될 것이다.
김경재 / 한신대학교 은퇴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