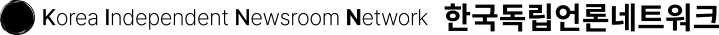[모두를 위한 평화] 이 사회가 은폐하는 끔찍한 폭력들
아홉 살 즈음이었던가. 가족들과 물놀이를 갔다가 이끼 낀 돌에 미끄러져 깊은 물에 빠진 적이 있다. 주변에 꽤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부모님도 동생들도 어느 한 사람도 내가 물에 빠지는 모습을 보지 못했던 모양이다. 발이 닿지 않는 깊은 물속, 아무리 물장구를 쳐도 수면까지 올라가는 건 불가능했다. 숨이 막혔다. 숨을 참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물을 서너 번 들이마시고 나니 정신이 혼미해졌다. 이 글을 쓰는데 수십 년 전의 그 공포가 너무나 생생해져서 스스로에게 놀란다.
그 순간의 절망감, 숨을 쉴 수 없는 그 답답함을 잊지 못한다. 그때까지 물속에서 눈을 한 번도 떠 본 적 없던 나는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눈을 번쩍 떴고 눈앞에 보이는 것을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그것은 동생들을 튜브에 태우고 있던 아빠의 다리였고, 아빠는 반사적으로 나를 들어 올렸다. 혼자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던 깊고 어두운 물에서 건져진 순간, 물 바깥으로 나와 숨을 쉬던 그 순간, 그 순간의 안도감을 잊지 못한다.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소식을 접했다. 모두가 그렇듯, 그가 했던 말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 "숨을 쉴 수 없다(I can’t breathe)." 그의 고통이 담긴 동영상을 재생하지 못했다. 그것을 목격할 자신이 없다. 그의 고통을 감히 헤아릴 수 없다. 상상도 할 수 없다. 그 '할 수 없음' 덕분에 나는 어제도 사람을 만나고 웃고 먹고 일상을 살았다.
하루 일과를 마친 퇴근길, 다음 열차가 10분 후에나 있다기에 계단을 질주해 지하철에 올라탔다.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다. 거리 두기가 불가능한 그 공간, 마스크를 쓰고 계단을 뛰어 내려온 까닭에 숨이 차올랐다.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마스크가 코와 입에 들러붙는다. 마스크를 벗어 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그 순간 그가 떠올랐다. 조지 플로이드. 숨을 쉴 수 없다.

대부분이 밀레니얼 세대인 피스모모 구성원 중 1980년대 학생운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다. 그이는 이따금씩 격렬한 기침을 하는 천식 환자다. 그가 해 줬던 이야기가 있다. 경찰이 시위하던 학생들을 지하도로 몰아넣었고 지하도에 빽빽하게 들어찬 학생들이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자 경찰들이 지하도 안으로 최루탄 다발을 던져 넣었단다. 밖에서는 무장한 경찰이 출구를 막고 있고, 안에는 최루탄이 터진 상태, 기절한 이들이 쓰러지고 쓰러진 이를 밟지 않으려는 필사의 노력 속에서 밟고 또 밟히던 아비규환의 기억. 숨을 쉴 수 없다. 천식 환자였던 그에게 그 순간은 어떤 공포였을까.
언론은 불타는 경찰서와 유리가 박살 난 명품 진열대를 비추며 폭동이라 보도한다. 누군가는 폭력을 행사하는 시위대의 위험성과 약탈의 부당함을 이야기하지만 정말 그러한가? 무엇이 약탈인가. 누가 누구를 약탈하는가. 한 달 월급의 몇백 배에 달하는 명품을 들고 나오는 이들의 모습이 약탈자로 보이는가? BBC에 따르면, 2020년 4월 기준 미국 시카고의 코로나19 사망자 중 72%가 흑인이다. 시카고 전체 인구 비중에서 흑인은 1/3에 해당한다. 미국 조지아주는 백인이 전체 인구의 58%인데, 확진자의 60%는 비백인으로 파악되었으며 영국 초기 코로나19 확진자 중 35%가 유색인종이었다. 영국과 웨일스의 유색인종 비율이 14%라는 통계를 생각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누가 누구를 약탈하는가. 명품 가방을 들고 나오는 것이 잘못인가? 평생 모아도 살 수 없을 만큼 비싼 시계가 존재하는 현실, 같은 직종에 종사하더라도 백인이 유색인종보다 5% 가까이 높은 급여를 받는 현실에서 과연 무엇이 약탈인가?
약탈을 뒷받침하는 악랄한 구조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아름다운 쇼윈도가 은폐하고 있는 끔찍한 폭력들, 자본 축적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현실에서 뉴스 소비자들은 곧잘 자본가 편을 든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면 공공재로 써야 한다는 뉴스에 달린 댓글을 보았다. 가장 추천을 많이 받은 댓글은 "자본주의사회에서 공공재가 말이 되느냐? 백신 개발에 투자한 사람과 그 국가가 먼저 쓰는 게 맞다"고 했다. 그러한가? 누가 누구를 위하는가?
데릭 쇼빈. 조지 플로이드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살인자'의 이름이다. 그는 어쩌다 그런 괴물이 되었을까. 자유의 나라, 기회의 나라 미국이라는 환상은 그의 무릎에서 산산이 부서졌다. 숨을 쉴 수 없다고 말했던 이는 조지 플로이드가 처음이 아니다. 2014년 뉴욕에서 에릭 가너(Eric Garner) 역시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했다. 그 순간 그도 말했다. 숨을 쉴 수 없다고.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안 됩니다"라는 절대적인 말을 나는 하고 싶지 않다. 폭력은 이 사회의 기본값이 되어 있다. 조금이나마 덜 폭력적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할 뿐, 그 노력은 번번이 짜여진 틀 속에서 미끄러진다. 경찰서를 불태우는 행위와 명품샵의 쇼윈도를 깨뜨리는 행위가 흑인의 목을 조르는 백인 경찰의 존재보다 끔찍한가? 팔레스타인 소년의 목을 짓누르는 이스라엘 군인의 무릎보다 끔찍한가?
8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을 짓누르는 백인 경관의 무릎 아래서, 자신을 둘러싸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 곁에서, 서서히 죽음을 마주하던 그에게 그 순간의 세상은 시꺼먼 물속보다 절망적이지 않았을까. 조지 플로이드가 마지막 숨을 내뱉으며 엄마를 불렀다고 했다. 그가 엄마를 꼭 만났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 절망 속에서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해 준 이의 얼굴을 마주하며 조금의 위안이라도 얻었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란다.
조지 플로이드를 애도하며 그렇게 삶을 잃어야 했던 수많은 사람의 고통에 부끄러움으로 연대하며 팔레스타인 난민 출신으로 뉴욕에서 활동하는 수헤어 하마드(Suheir Hammad)의 시를 나눈다.
"I will dance and resist and dance and
persist and dance. This heartbeat is louder than
death. Your war drum ain’t
louder than this breath.
(나는 춤추고 저항하고 춤추고 계속하고 춤출 것입니다.
이 심장의 고동은 죽음보다 더 큰 울림입니다.
당신이 울리는 전쟁의 북소리는 이 숨소리보다 더 크게 울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