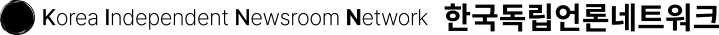<뉴스앤조이>가 지향하는 변화는 '연결' 속에 있다
| 이 글은 2025년 6월 21일 <뉴스앤조이> 창간 25주년 기념 포럼 '교회 개혁과 저널리즘, 뉴스앤조이 역할과 과제는'에서 발표된 발제문입니다. - 편집자 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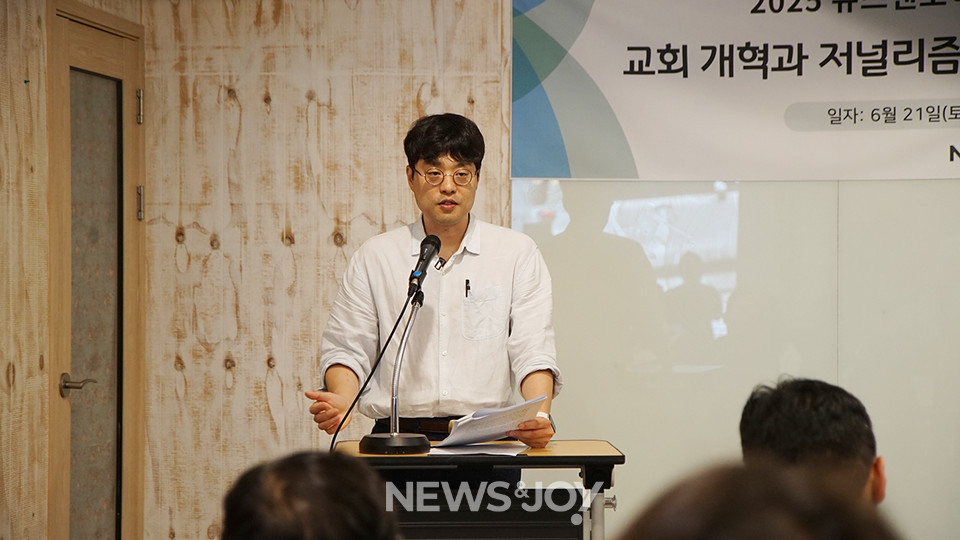
"기독교 생태계 안에서 과연 언론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뉴스앤조이>가 이번 발제를 부탁하면서 내게 던진 질문이다. 저널리즘 연구자로서 나는 이 고민을 <뉴스앤조이>의 '인식론 성찰' 과정의 일부로 봤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뉴스앤조이>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기대하게 됐다.
| 언론 인식론 |
저널리즘 사회학 분야에서 언론 인식론은 저널리즘 경계 내부에서 만들어진 지식과 진실에 대한 주장을 뜻한다.1) 언론은 특정 정보를 공적 가치를 지닌 지식으로서 사회에 제시하고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제도적 기관이다. 이 활동의 기반이자 결과가 바로 언론 인식론인데, 언론인들은 그것을 가치, 규범, 습관, 기술, 내러티브 등의 도구들을 담고 있는 일종의 "문화적 연장통(cultural toolkit)"(Swidler, 1986)으로 활용하면서 지식 주장과 행위 전략을 구성한다.
언론 인식론은 기자가 자기 일을 대하는 방식, 특히 뉴스 선택, 생산, 배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언론학자의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기자는 자신이 아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기자는 자기가 알게 된 것이 공적 지식으로서 가치 있다고, 따라서 뉴스로 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하는가? 기자는 이런 지식 주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중심으로 언론학자들은 언론 인식론을 주로 언론 관행이나 메타 언론 담론–언론이 생산하는 언론, 뉴스, 기자에 관한 이야기–측면에서 연구해 왔다(Ekström et al., 2021).
저널리즘 장르에 따라 인식론은 다양하다. 예컨대, 매일매일 뉴스를 전하는, 이른바 일간 기자와 긴 호흡으로 취재해 보도하는 탐사 기자의 인식론적 관행은 다르다(Ettema & Glasser, 1985). 취재 및 보도 영역을 정해 두고 취재하는 출입처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얻는 일간 언론 환경에서 기자의 지식은 소스에 의해 미리 정당화한다(이정훈, 2022). 즉, 일간 기자는 자기가 알게 된 것의 진실 여부를 스스로 입증하기보다는 관료, 정치인, 교수 등 전문가 정보원이 확보하고 있는 신뢰성을 수용함으로써 확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인식론적 관행을 토대로 일간 언론은 주로 정확하고 중립적이고 신속한 보도를 하겠다고 사회에 약속한다.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지면과 프로그램을 채워야 하는 일간 언론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인식론을 개발한 셈이다. 그러나 탐사 언론 맥락에서는 기자가 자신의 지식 주장의 신뢰성을 능동적이고 독립적으로 입증해야만 한다. 탐사 기자는 제보의 중대성과 취재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탐사 기자는 또한 획득한 정보의 신뢰 정도를 평가해야 하고, 분산된 정보 조각들이 지식 주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야기 구조 속에 배열해야 한다. 탐사 언론 인식론의 핵심인 이 지식 정당화 과정은 자신이 보도하는 정보에 있어서 탐사 기자가 일간 기자보다 더 높은 책임감을 갖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Ettema & Glasser, 1998).
언론 인식론 개념은 새로운 저널리즘 유형이 뉴스에 초래하는 변화를 이해하는 데에 유용하다. 지식의 조건, 그런 지식을 얻는 방법과 정당화 노력에 언론 인식론이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인식론상 차이는 기존 뉴스와 다른 뉴스가 생산되는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엑스트롬 등(Ekstrom et al., 2022)은 스칸디나비아 언론사들을 사례로 데이터 저널리즘의 인식론적 특성을 분석했다. 그들은 데이터 저널리즘을 강조하는 언론사 중 일부가 뉴스거리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전통적인 뉴스 가치에 앞서 수용자 지표를 활용하고, 내용적 차이보다는 뉴스 전달과 패키징 측면에서의 차별화에 지나치게 집중함으로써 지식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한다는 점을 밝혔다. 물론 지역적 특색이나 언론사별 자원 수준 등과 같은 요인에 따라 데이터 저널리즘 인식론의 발전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도 있긴 하지만(Borges-Rey, 2020), 이런 인식론을 제도화한 언론사는 디지털 환경에서 주목 경제 논리에 적합한 뉴스를 우선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경제적, 기술적, 문화적 요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언론 인식론은 변할 수 있다. 언론학계는 특히 기술의 발달로 인한 언론 인식론 변화에 주목해 왔는데(Coddington, 2019; Matheson & Wahl-Jorgensen, 2020), 쉴 틈 없이 속보를 전해야 하고 온라인 생중계가 표준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기자들의 언론 인식론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분석한 엑스트롬 등의 연구(Ekstrom et al., 2021)가 일례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속보와 라이브 방송을 우선시하는 언론사에서는 기자들이 시간에 쫓김으로써 취재의 완결성 측면에서 자기 자신이나 소속사가 표명해 온 지식 주장과 어긋한 상태, 즉 "인식론적 불일치(epistemic dissonance)"를 경험할 수 있다(114~115쪽). 이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기자들은 저널리즘의 전통적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사실 확인 규범을 느슨하게 따르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언론이 인식론적 전환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직면할 때도 있다. 이는 사회가 언론의 주요 지식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인식론적 행위 전략을 불용하다고 여기는 상황으로서 뉴스 신뢰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거나 언론에 대한 부정적 담론이 확산하는 등의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여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 제도가 자신이 속한 사회와 동떨어진 상태라고 진단한 젤리저 등(Zelizer et al., 2021/2023)은 특히 규범, 엘리트, 수용자와 관련한 언론의 지식 주장이 사회적 설득력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언론의 이상과 실제 사이의 괴리가 커진 것인데 한국 언론도 예외는 아니다.
수년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해 온 뉴스 신뢰도가 반영하는 것처럼(Newman et al., 2024), 오늘날 한국 주류 언론의 지식 생산 제도로서의 지위는 위태롭다. 이는 한국 언론장(場, field) 내부에 만연한 인식론적 불일치와 관련 있는 현상이다. 한국 언론은 제도적, 형식적 측면에서 감시 기능, 해설과 비평, 공론장 역할 등 민주주의적 가치의 중요성을 점진적으로 주장해 온 반면, 그 가치 구현을 어렵게 하는 제약까지 극복해 내지는 못한 것이다(박진우, 이정훈, 2016; 조항제, 2017). 특히 한국 언론장에는 전술했던 일간 언론 인식론이 주류로 자리하면서 '받은 정보'에 우선적 가치를 부여하고 그 내용을 정확하고 중립적이고 신속하게 전하는 데에 전념하는 기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이정훈, 2022). 이 주류 언론 인식론은 피의 사실 보도 관행(박영흠, 2023)과 깊이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뉴스 환경에서 진화하면서 소셜 미디어 취재원 인용(김선영, 2024; 유수정, 2019)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전통적 인식론만으로 더 이상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입증하기 어려워졌다면 언론은 "총괄적·집단적·지속적인 성찰과 수정[을 통해] (중략) 사회제도가 속한 맥락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고(Zelizer et al., 2021/2023, 95~103쪽), 이는 "인식론적 성찰(epistemic reflexivity)"(Lunn Brownlee et al., 2017), 즉 기존 인식론을 반성하고 여러 대안적 관점을 사회적 맥락에 따라 평가함으로써 관련 행위를 유지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실제로, 기성 언론인들이 소위 "따옴표 저널리즘"이라 불리는 관성적 받아쓰기가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라면서 자성하거나(김양진, 2025/1/18), 현대적 맥락에서 "저널리즘 원칙에 충실하고 많은 사람의 공감을 살 수 있는 새로운 기사를 공부하고 생산"하고자 자발적으로 연대체를 구성하는 등(저널리즘 클럽 큐, 2025), 최근 들어 한국 언론장 내부에서도 인식론적 성찰의 증후가 간간이 눈에 띈다.
하지만 한국 주류 언론이 실제 인식론 전환을 이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언론장 핵심부를 차지한 기성 언론인들은 보수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언론 제도는 지식 제공자로서의 인식론적 지위를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는, 따라서 반성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Zelizer et al., 2021/2023). 젤리저 등이 "환상(illusion)"이라고 깎아내린 이러한 신념은 "경계선 작업(boundary work)"(Carlson & Lewis, 2019), 즉 언론과 언론 아닌 것을 구분 지음으로써 제도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언론계의 상징 투쟁에 의해 기자들의 인식 속에 뿌리내리고 유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식론은 취재 관행, 인정 기제, 조직 문화 등 언론 문화와도 깊이 얽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직 체화하지 않은 기자직 초년생에게조차 영향을 미쳐서 그들의 취재와 보도를 틀 짓고는 한다(Mishaly & Reich, 2024).
요컨대, 언론 인식론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가변적인 것이지만, 언론은 관성에 따라 사회와 동떨어진 지식 주장을 굽히지 않고 버틸 수 있다. 이는 "인식론 경쟁(epistemic contest)"(Carlson, 2023)에서 경합 중인 언론 행위자들의 성찰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석함으로써 가시화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 언론 인식론 경쟁, 독립 언론, 그리고 <뉴스앤조이> |
인식론 경쟁은 언론이 제공하는 지식과 그 지식을 생산하는 방식의 적정성 등을 두고 펼쳐지는 상징적 경쟁을 말한다. 이 개념을 제안한 칼슨(Carlson, 2023)은 언론 인식론 경쟁은 다양한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 없이 지속적으로 펼쳐지는 논쟁이므로 단일 연구로 그 복잡성을 일반화하려 하기보다는 구체적이고 맥락화한 연구 결과를 학계가 함께 축적하자고 제안했다. 이런 "공동의 노력"으로만 언론 인식론 경쟁의 경향성과 이를 야기하는 사회의 권력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취지인데, 칼슨은 이를 위해서는 인식론 경쟁에 참여한 행위자들을 통찰할 수 있는 "생산적인" 사건을 선별하여 "역사적" 혹은 "실증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11~12쪽; 강조 본문).
<뉴스앤조이>를 포함한 독립 언론의 활동이야말로 당대의 언론 인식론 경쟁을 실증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해 주는 "생산적인" 사건이다. 독립 언론은 특히 언론 인식론 경쟁에 진보적인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언론장 내부에 건설적인 긴장을 유발한다. 일각에서는 언론장의 경계선상에 위치한 뉴스 행위자라는 의미에서 독립 언론을 경계 언론(peripheral journalism)의 하나로 본다. 이 관점은 '중심부-주변부'로 언론장을 이분화하고 주변부의 뉴스 행위자들을 언론이 무엇을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전통적, 주류적 언론 인식에 도전하는 세력, 그럼으로써 언론 인식을 재구성하는 이들로 상정한다.
엘드리지(Eldridge, 2019)는 경계 언론 행위자를 '적대적 혹은 파괴적인' 유형과 '투쟁적인' 유형으로 구분한다. 전자는 저널리즘의 존재 이유에 관심이 없거나 의도적으로 그것을 부인하는 행위자로서 사실상 저널리즘에 파괴적인 결과를 야기하는 방식으로 뉴스(혹은 뉴스와 유사한 뭔가)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세력인 반면, 후자는 기성 언론의 "비판적인 동료"로서 저널리즘이 더욱 저널리즘다울 수 있도록 기존 인식에 도전하고 새로운 행위 전략을 개발하는 행위자이다.
엘드리지의 구분법을 따른다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독립 언론임을 천명한 <뉴스앤조이>는 저널리즘을 위해 '투쟁하는 행위자'이다. <뉴스앤조이>는 기독교 생태계의 정상적 작동에 기여하는 지식을 제공하는 데에 방해가 될 만한 요소를 목적 의식적으로 배제함으로써–예컨대, 금권과 교권에 얽매이지 않기 위한 사업 모델의 개발–"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거나 그렇게 해 주리라고 기대하는, 우리 언론학자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사회에 이야기하는 저널리즘"(정준희, 2023, 8쪽)의 실재를 실증해 보인다. <뉴스앤조이>는 또한 언론이 더욱 언론답길 바라는 마음에 기성 언론 인식, 관행, 역할, 동기 등과 차별화하고, 그 과정에서 통념을 깨고 대안을 제시한다. 기성 언론, 특히 교계 언론이 의존해 온 낡은 규범과 관행에 얽매이기보다는 실천의 유의미한 지침이 되는 가치를 개발하고 추구함으로써 <뉴스앤조이>는 저널리즘의 사회적 정당성을 회복시킨다.
특히, <뉴스앤조이>의 핵심 가치인 "정직", "공의", "변화"는 <뉴스앤조이>가 기독 언론과 기독 언론 아닌 것 사이의 경계, 기독 언론이 생산한 지식과 다른 것이 생산한 지식 사이의 경계를 구축하는 수단으로 <뉴스앤조이>가 선택한 문화적 도구들이다. "신앙과 양심을 걸고 정직을 추구"하겠다는 다짐과 "공의로운 언론이 되고자 한다"라는 선언은 오늘날 수없이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기독 언론(만)이 제공할 수 있는 지식, 아니 기독 언론이기에 제공해야만 하는 지식이 무엇인지를 <뉴스앤조이>가 성찰한 결과일 것이다. <뉴스앤조이>의 "생명, 평화, 사랑, 정의"의 저널리즘은 기독교인들이 당대의 교회와 복음 사이의 거리를 판단하는 가늠자 역할을 한다. 이런 저널리즘은 <뉴스앤조이>의 바람처럼 "교회와 사회에 건강한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단, 이는 기성 언론 인식론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자극(뉴스) → 반응(변화)'이라는 공식 속의 변화, 즉각적이고 분명하고 가시적인 효과–예컨대, 댓글이 얼마나 달렸는지, 페이지 뷰는 얼마나 되는지, '좋아요'는 얼마나 받았는지, 유명 정치인 혹은 목사가 기사를 언급했는지, 기사로 인하여 기자회견이 열렸는지, 기사의 영향으로 '나쁜 놈'이 구속됐는지 등등–와는 다르다. "교회와 사회에서 소외된 약자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힘을 쏟는 공의로운 언론이 되고자 한다"라는 고백에서 엿볼 수 있듯이, <뉴스앤조이>가 지향하는 변화는 '연결' 속에 있다. <뉴스앤조이>의 뉴스는 사람, 교회, 사회를 복음으로 잇는다. 그런 뉴스가 일으키는 변화는 점진적이고, 암묵적이고, 간접적이고, 매개적이고, 과정적이다. 이 연결의 언론 인식론은 지식 공급자와 수용자 사이의 구분을 지운다는 점에서 전복적이다.
신우열 / 전남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각주 |
|
참고 문헌 김선영. (2024). 큰따옴표 저널리즘의 현주소: '이대남' 보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4권 6호, 126-140. 김양진 (2025, 1, 18). '받아쓰기 언론' 기계적 균형, 민주주의 훼손한다. <한겨레21>.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6744.html 박영흠. (2023). 피의 사실 보도의 요건: 윤리적 범죄 수사 보도를 위한 원칙. <미디어와 인격권>, 9권 2호, 123-163. 박진우, 이정훈 (2016). 민주화 시대의 언론과 '민주주의적 가치'의 후퇴: 언론인 의식 조사 자료에 대한 검토, 1989∼2013. <한국방송학보>, 30권 5호, 43-80. 유수정 (2021). 소셜미디어 취재원 인용에 대한 연구. <미디어, 젠더 & 문화>, 36권 3호, 5-46. 이정훈 (2022). 지식 체계로서의 뉴스. <인문사회과학연구>, 23권 4호, 399-430. 저널리즘 클럽 큐 (2025). 정관. <사단법인 저널리즘클럽Q>. https://www.journalismclubq.or.kr/%EC%84%A4%EB%A6%BD-%EC%B7%A8%EC%A7%80-%EB%B0%8F-%EC%97%B0%ED%98%81 정준희 (2023). 추천사: 저널리즘의 장기 혁명을 알리는 조종. In B. Zelizer, P.J. Boczkowski, & C. W. Anderson, (2021). The journalism manifesto. Polity. [신우열, 김창욱 (역) (2023). <저널리즘 선언: 개혁이냐 혁명이냐>. (7-13쪽). 오월의봄.] 조항제. (2017). 한국의 민주화와 언론 1987∼ 2017. <언론과 사회>, 25권 3호, 11-78. Borges-Rey, E. (2020). Towards an epistemology of data journalism in the devolved nations of the United Kingdom: Changes and continuities in materiality, performativity and reflexivity. Journalism, 21(7), 915-932. Carlson, M. (2023). Epistemic Contests in Journalism: Examining Struggles over Journalistic Ways of Knowing. Digital Journalism. https://doi.org/10.1080/21670811.2023.2288392 Carlson, M., & Lewis, S. C. (2019). Boundary work. In K. Wahl-Jorgensen & T. Hanitzsch (Eds.), The handbook of journalism studies (pp. 123-135). Routledge. Coddington, M. (2019). Aggregating the news: Secondhand knowledge and the erosion of journalistic authority. Columbia University Press. Ekström, M., Ramsälv, A., & Westlund, O. (2021). The epistemologies of breaking news. Journalism Studies, 22(2), 174-192. Ekström, M., Ramsälv, A., & Westlund, O. (2022). Data-driven news work culture: Reconciling tensions in epistemic values and practices of news journalism. Journalism, 23(4), 755-772. Eldridge II, S. A. (2019). Where do we draw the line? Interlopers,(ant) agonists, and an unbounded journalistic field. Media and Communication, 7(4), 8-18. Ettema, J. S., & Glasser, T. L. (1985). On the epistemology of investigative journalism. Communication, 8, 183-206. Ettema, J. S., & T. L. Glasser. (1998). Custodians of conscience: Investigative journalism and public virtue. Columbia University Press. Lunn Brownlee, J., Ferguson, L. E., & Ryan, M. (2017). Changing teachers' epistemic cognition: A new conceptual framework for epistemic reflexivity. Educational Psychologist, 52(4), 242-252. Matheson, D., & Wahl-Jorgensen, K. (2020). The epistemology of live blogging. New Media & Society, 22(2), 300-316. Mishaly, T., & Reich, Z. (2024). Knowledge can wait? The epistemic conversion of new beat reporters. Journalism. https://doi.org/10.1177/1464884924128400 Newman, N., Fletcher, R., Robertson, C. T., Ross Arguedas, A., & Nielsen, R. K. (2024). Reuters Institute digital news report 2024. Reuters Institute for the Study of Journalism. Swidler, A. (1986). Culture in action: Symbols and strateg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1(2), 273-286. Zelizer, B., Boczkowski, P. J., & Anderson, C. W. (2021). The journalism manifesto. Polity. [신우열, 김창욱 (역) (2023). <저널리즘 선언: 개혁이냐 혁명이냐>. 오월의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