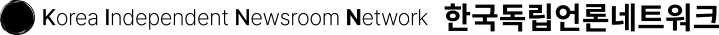페미니스트 신학자와 치매 아버지 총 8건의 기사가 있습니다.
-
![[페미니스트 신학자와 치매 아버지] 나는 내 치매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https://cdn.newsnjoy.or.kr/news/thumbnail/202401/305992_103419_5027_v150.jpg)
[페미니스트 신학자와 치매 아버지] 나는 내 치매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채은(가명)아, 알츠하이머에 걸린 네 할아버지와 우리 가족의 동거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공개하기로 한 뒤, 나는 우리가 함께 겪은 일들을 여러 꼭지로 나누어 글을 쓰기로 기획했단다. 연재의 마무리로는 '나는 내 치매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소제목을 달아 놓았지. 제목을 의문형으로 달아 놓고 생각을 정리해 보려고 했지만, 솔직히 마지막 제목을 그렇게 계획했을 때부터 이 연재를 '나는 내 치매를 결국 받아들일 것이다'라는 결론으로 끝내려고 했던 거 같아. 늘 구원의 소망을 말하는 신학자라는 직업 습관이 그러한 해피 엔딩을 기획하게
연재김혜령2024-01-01 -
![[페미니스트 신학자와 치매 아버지] 돌보는 자의 신학](https://cdn.newsnjoy.or.kr/news/thumbnail/202312/305941_103279_2818_v150.jpg)
[페미니스트 신학자와 치매 아버지] 돌보는 자의 신학
몇 학기 전부터 학교 업무가 과도하지 않은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나 이번 학기 들어서는 아침부터 진을 뺄 엄두가 나지 않아 거의 모든 날을 자동차로 출근하였다. 기말을 앞둔 12월 초가 되자 겨우 아침 스케줄이 한가해진 날이 생겼다. 오랜만에 차를 놓고 출근했기에 당연히 퇴근길은 지하철로 와야만 했다. 집 근처 지하철역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6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미 어둑해진 초겨울 퇴근길, 한차례 이슬비가 내려 짙어진 아스팔트 거리는 더욱 어두워 보였다. 10여 분 정도만 걸으면 집에 닿을 수
연재김혜령2023-12-18 -
![[페미니스트 신학자와 치매 아버지] 가장 고마운 사람들, 그러나 고마움의 이유를 다시 물어야 한다](https://cdn.newsnjoy.or.kr/news/thumbnail/202311/305909_103134_5812_v150.jpg)
[페미니스트 신학자와 치매 아버지] 가장 고마운 사람들, 그러나 고마움의 이유를 다시 물어야 한다
작년 여름 아버지를 모시고 엄마와 함께 처음으로 구립 데이케어센터(케어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하던 날을 나는 쉽게 잊을 수 없다. 그때 우리 가족은 아버지의 배회를 우리 힘만으로는 통제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는데, 언제라도 아버지의 실종 사고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사실이 온 가족을 두렵게 하였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장 가까운 케어센터에 전화를 걸어 간단한 상담을 했는데, 당시 한참 유행이던 코로나 덕분에 빈자리가 있어 다음 날 바로 대면 상담을 할 수 있었다. 관리 행정 전반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팀장이 엄마와 나, 그리고 아버지
연재김혜령2023-11-28 -
![[페미니스트 신학자와 치매 아버지] 치매 환자의 슬기로운 사회생활](https://cdn.newsnjoy.or.kr/news/thumbnail/202311/305867_103012_3919_v150.jpg)
[페미니스트 신학자와 치매 아버지] 치매 환자의 슬기로운 사회생활
광복을 1년 앞두고 할아버지가 병환으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그때 이미 할머니의 배 속에 있었다.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대기 좋은 '유복자'로 태어난 것이다. 해방과 한국전쟁을 겪으며 어느 집이 풍요로웠겠냐마는, 가장이 없는 아버지 집은 동네에서 알아주는 가장 가난한 집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할머니의 집이 원래부터 형편이 나쁜 것은 아니었다. 구한말 한 지방관리의 사랑 많이 받는 수양딸로 입양된 할머니는 일제 치하 여자아이들에게는 매우 드물었던 '국민학교'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글자를 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신을 과부라고 무시하던
연재김혜령2023-11-13 -
![[페미니스트 신학자와 치매 아버지] 가장 미안한 사람들, 그러나 미안함의 이유를 다시 물어야 한다](https://cdn.newsnjoy.or.kr/news/thumbnail/202310/305805_102862_4012_v150.jpg)
[페미니스트 신학자와 치매 아버지] 가장 미안한 사람들, 그러나 미안함의 이유를 다시 물어야 한다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고 두 달쯤 되었을 때 나는 서둘러 합가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치매 증상 중 하나인 의처증과 난폭성이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있기는 했지만,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단 한 번의 사고로도 두 분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모님은 완강히 반대하셨다. 은퇴 이후, 부모님은 새로 이사 간 도시에 두 분만의 독립된 공간을 정성스럽게 가꾸며 적응해 왔기 때문에, 다시 자녀와, 그것도 아들이 아니라 딸의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을 제안받은 것만으로도 마치 자신들의 삶이 실패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연재김혜령2023-10-24 -
![[페미니스트 신학자와 치매 아버지] 모든 기억이 사라진 자리, 가부장제가 남았다](https://cdn.newsnjoy.or.kr/news/thumbnail/202310/305750_102728_4615_v150.jpg)
[페미니스트 신학자와 치매 아버지] 모든 기억이 사라진 자리, 가부장제가 남았다
추석날 아침 일찍 집에 온 남동생 가족과 바통 터치하듯 아버지를 맡기고 시댁에 갔다. 그러나 저녁이 되기 전에 남동생에게 전화가 왔다. 동생은 아버지가 자기를 못 알아보고, 자꾸 집에 돌아가라 한다고 했다. 치매 환자가 가족을 못 알아보게 되는 것은, 모든 아이가 자라고 모든 인간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젠가 결국 일어날 일이다. 그런데도 나는 이상하리만큼 단 한 번도 그런 날을 제대로 상상한 적이 없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절대 잊을 수 없고, 잊어서도 안 된다고 감히 믿어 온 것이다.서둘러 집에 돌아오면서도 마음이 진정되
연재김혜령2023-10-09 -
![[페미니스트 신학자와 치매 아버지] 우스꽝스러운 옷차림이 내게 질문합니다](https://cdn.newsnjoy.or.kr/news/thumbnail/202309/305663_102498_2634_v150.jpg)
[페미니스트 신학자와 치매 아버지] 우스꽝스러운 옷차림이 내게 질문합니다
첫 번째 글을 읽고 열일곱 살 딸아이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면서도, "우리가 실제로 사는 것보다는 좀 더 어둡고 무겁게 그려진 거 같아. 왜, 실제는 꽤 그럭저럭 괜찮은데 글로 쓰면 너무 진지해지잖아. 할아버지와 같이 사는 게 그렇게 매일 힘들거나 슬픈 건 아니잖아?"라고 말했다. 딸아이의 피드백은 첫 원고를 송부하고 매체에 공개되기도 전에 아버지의 예상치 않은 외출로 다시 불편해졌던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 같았다. 그렇다. 치매 환자와 함께 사는 일이 늘 우울한 감정들에만 메이게 하는 것은 아닌데, 혹여나 독자에게
연재김혜령2023-09-18 -
![[페미니스트 신학자와 치매 아버지] 도어락, 아버지의 외출](https://cdn.newsnjoy.or.kr/news/thumbnail/202309/305610_102356_1020_v150.jpg)
[페미니스트 신학자와 치매 아버지] 도어락, 아버지의 외출
결국 두 주 전 '치매 도어락'이라는 별명이 붙은 최신식 양방향 도어락으로 현관문 잠금장치를 교체하였다. 사실 작년에도 도어락 교체를 고민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합가한 집에 투박한 디자인이 너무 어울리지 않아 선뜻 마음을 먹지 못했다. 다행히 1년 만에 겉으로는 일반 도어락과 구분이 되지 않는, 꽤 괜찮은 디자인의 양방향 도어락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작년에 교체하지 않은 이유를 디자인 탓이라고만 할 수 없었다. 그때 바꾸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알츠하이머 치매인 아버지가
연재김혜령2023-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