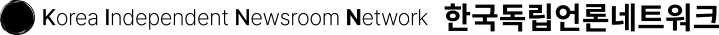한국 기독교 반성폭력 운동과 피해자 섹슈얼리티 총 11건의 기사가 있습니다.
-

취약한 피해자의 섹슈얼리티를 급진적으로 사유할 용기
그동안 우리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소속 주요 교단의 성폭력특별법 제정 운동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 기독교 반성폭력 운동의 역사적 맥락과 운동 담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그 한가운데에 놓인 기독교 여성/피해자의 섹슈얼리티에 관해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목회자 성폭력을 중심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던 운동의 맥락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그러한 방식의 운동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한계들을 짚어 보고 더 많은 공동체 내 폭력을 직면하고 아우를 수 있는 대안 담론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기독교 성폭력 피해자들을 심
연재강은정2023-09-28 -

교회 성폭력 개념과 유형의 재구성
우리는 앞선 8회의 연재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 소속 주요 교단의 성폭력특별법 제정 운동을 중심으로 한국 기독교 반성폭력 운동의 역사적 맥락과 운동 담론, 그리고 피해자 섹슈얼리티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은 두 번의 연재는 앞서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기독교 성폭력 피해자와 기독교 여성의 섹슈얼리티 논의에 관한 몇 가지 방향과 아이디어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반성폭력 운동은 최소 25년의 역사 동안, 반복되는 목회자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각 교단에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저항하고 투쟁해 왔습니다
연재강은정2023-09-13 -

기독교 여성의 몸에 교차하는 특수한 권력, '신학'과 '신앙'(하)
지난 호에 이어 기독교 성폭력 피해자들의 섹슈얼리티에 교차하는 '신학'과 '신앙' 이야기를 이어 가 보겠습니다. 운동의 맥락을 거치며 대부분 교단 문헌에 구성된 성폭력에 관한 신학적 진술은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 성폭력에 관해 매우 급진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성폭력을 하나님이 부여하신 선물에 대한 남용이자 신에 대한 모독으로, '동등한 성적 권리'와 '평등한 몸'을 가진 '성적 주체'의 경계를 함부로 침해한 죄로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신학적 진술 내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계속해서 '약자, 취약한 성인, 요보호
연재강은정2023-08-30 -

기독교 여성의 몸에 교차하는 특수한 권력, '신학'과 '신앙'(상)
우리는 기독교 반성폭력 운동의 과정에서 구성된 피해자의 섹슈얼리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제왕적 목회자와 요보호 피해 여성'이라는 프레임이 구성된 운동의 배경과 이에 따른 실천적 한계에 관해 다뤘고요. 지난 글에서는 기독교 성폭력 피해자의 섹슈얼리티가 '화간'을 저지르는 음란하고 위험한 '상간녀'와, 벗어날 수 없는 가족 굴레 속에서 무차별적 폭력의 대상이 되는 순결하고 연약한 '친족 성폭력 피해자' 사이에 취약하게 놓이게 된 여러 가지 맥락을 살펴봤습니다.성폭력이 자꾸만 화간으로 굴절되는 피해 현장에서 내렸던 처절
연재강은정2023-08-17 -

'화간'과 '친족 성폭력' 사이에 놓인 '취약한' 여성의 위치
최근 방송 매체에서 기독교 성폭력에 대한 보도나 심층 취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이 없고 피해자 탓을 하는 목회자들이거나, 자진 사퇴를 면피 수단으로 삼아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는데도 이를 적절히 통제하고 관리할 장치·제도가 없는 각 교단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연재가 저로서도 부담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래서 더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논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지난 글에서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기독교 반성폭력 운동의 맥락에서 구성된 '피해자 섹슈얼리티'에
연재강은정2023-08-02 -

'제왕적 목회자'와 '요보호 여성 피해자'라는 프레임
지난 4회 차까지는 한국 기독교 반성폭력 운동이 촉발된 1990년대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운동의 맥락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지난 글에서는 각 교단별 성폭력특별법 제정이 난항을 겪는 동안 운동 주체들이 교단 헌법 개정, 예방 교육 의무화, 지침서 발간 등의 대안적 실천을 모색한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최선이 아닌 차선이었지만, 지치지 않고 달린 피해자들과 운동 주체들 덕분에 최근 운동은 여러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이번 글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의 주제인 '피해자 섹슈얼리티'를 다뤄 볼 텐데요. 운동의 맥락 속에서 '피해자 담론'이 어떻게
연재강은정2023-07-1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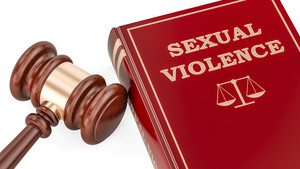
각 교단의 성폭력특별법 제정 난항과 대안 모색
지난 글에서는 한국 기독교 반성폭력 운동이 각 교단의 성폭력특별법 제정 운동과 함께 여성 대표성, 즉 여성 안수 운동에 박차를 가해야 했던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교단별 직제·구조·상황에 따라 다양한 운동 방식과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 또한 들여다봤지요. 이번 글에서는 특별법 제정이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운동 주체들이 모색해 온 다양한 대안을 살피려고 합니다. 옳고 그름을 평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장벽 앞에서도 멈추지 않고 전진해 왔던 피해자들과 운동 주체들의 발자취를 기억하고, 향후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의
연재강은정2023-07-06 -

'성폭력을 성폭력이라 말할 수 있는 자들'조차 없었기에
지난 글에서 우리는 한국 기독교 반성폭력 운동이 목회자 성폭력 사건을 중심으로 투쟁하게 된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1994년 제정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사회 법)'과 교회법 사이의 '사각지대'에 놓인 목회자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운동 주체들이 공청회·토론회·연구·교육 등을 진행하며 운동 담론을 심화시켜 나간 맥락을 짚어 봤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운동 주체들이 각 교단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된 더 큰 문제와 현실에 대해 다뤄 보려고 합니다.1980년대에 접어들
연재강은정2023-06-2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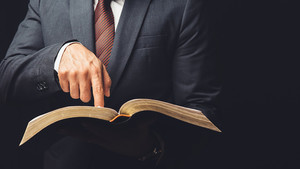
목회자 성폭력의 가시화와 최초의 교회 성폭력 공청회
지난 글에서는 한국 기독교 반성폭력 운동이 세계, 특히 아시아 여성운동의 맥락 속에서 싹을 틔웠다는 점, 기독교 역사의 뿌리 깊은 여성 혐오와 한국 사회의 성차별을 자각한 여성 신학자·목회자, 교회 여성 연대들을 토양으로 시작됐다는 점을 다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독교 성평등 운동의 맥락에서 촉발한 기독교 반성폭력 운동이 본격적으로 '목회자에 의한 성폭력(목회자 성폭력)'을 중심으로 투쟁하게 된 이유와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기독교 반성폭력 운동은 목회자 성폭력 사건을 '반복적으로' 마주하면서 오늘날까지
연재강은정2023-06-07 -

'성차별 철폐 운동'의 흐름 속에 태동된 '한국 기독교 반성폭력 운동'
교회에서 성폭력에 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동안 참 어렵고 예민한 문제로 간주돼 왔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에서는 성폭력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학생회·청년회를 거치면서도 '누가 누구랑 사귄대', '사귀다 헤어져서 교회 안 나오잖아'라는 식의 연애 후일담(?) 같은 소문만 무성했던 기억이 납니다.그런데 생각해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개인 사이에 다양한 경계 침해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반성폭력센터가 2021년 교인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개
연재강은정2023-05-24 -

한국교회가 '목회자 성폭력' 해결에만 머무르지 말아야 할 이유
△기독교 반성폭력 운동 △교회 성폭력 △목회자 성폭력 △성폭력특별법 △피해자 섹슈얼리티 △피해자 담론 △젠더화된 신앙생활[뉴스앤조이-여운송 기자] 올해 2월 발표된 어느 석사 학위논문이 초록抄錄에서 밝히고 있는 주제어 목록이다. 하나같이 한국교회가 놓쳐서는 안 되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담은 키워드들이다. 그래서 논문을 다 읽었다. 홍익인간이라 했던가. 이로운 것은 되도록 많은 사람과 나눠야 한다. 연구자를 찾아 나섰고, 흔쾌히 연재 약속을 받아 냈다.연재 필자는 안양나눔여성회 사무국장 강은정 활동가. 그는 시민단체에 몸담고
연재여운송2023-05-16